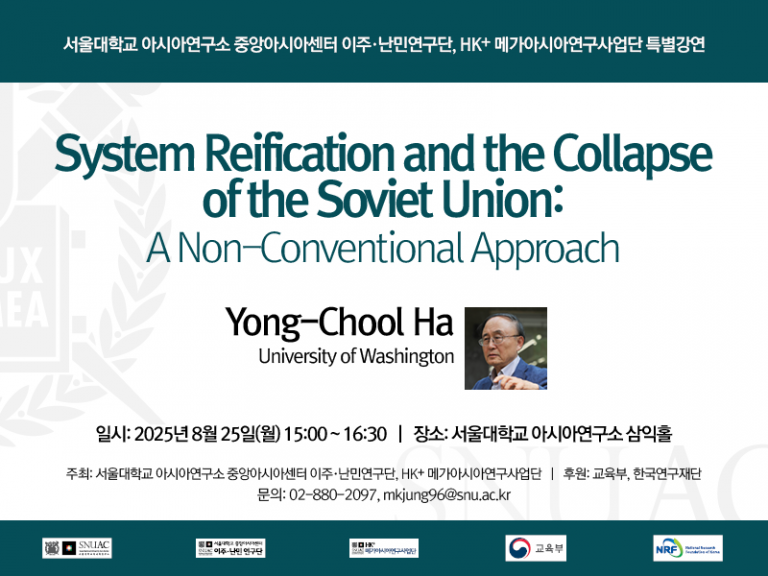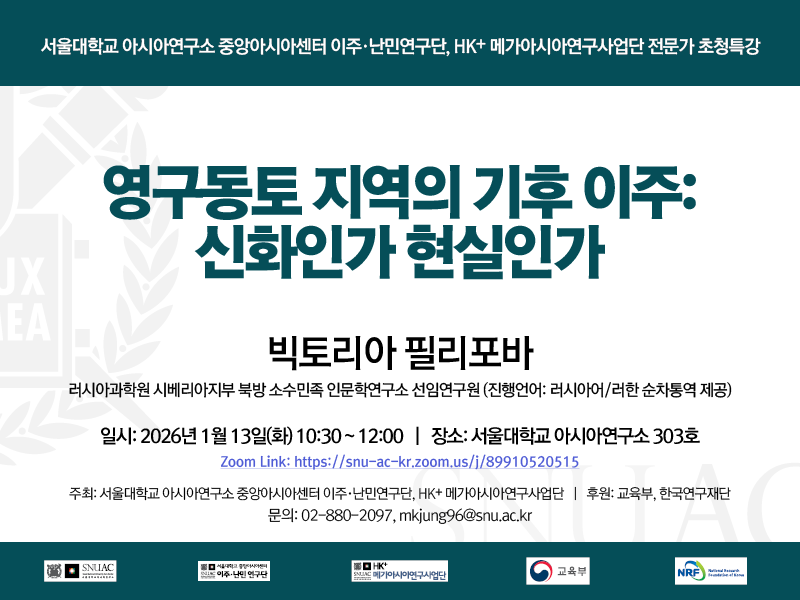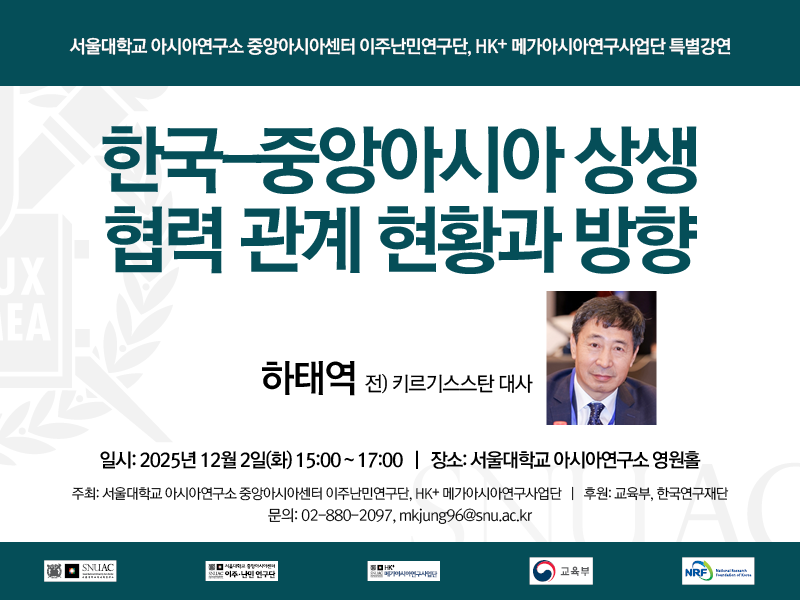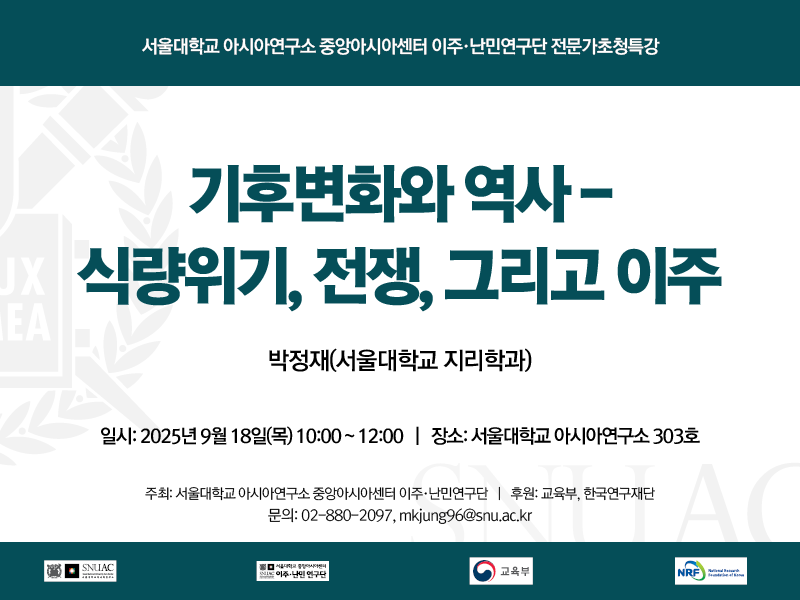- Center for Eurasian and Central Asian Studies(CECAS)
- 02-880-2097
- centralasia@snu.ac.kr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제10회 전문가초청특별강연

2025년도 7월호: ‘녹아내리는 땅’에 사는 사람들: 러시아 사하(야쿠티야) 공화국의 기후 변화와 일상
2025년 7월 31일
2025년도 8월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을 추방하려고 하는가?
2025년 8월 31일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은 2025년 8월 25일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인 하용출 교수(워싱턴대학교)를 초청하여 “System Reification and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 Non-Conventional Approach”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본 강연에서 하 교수는 소련의 해체를 단순한 외형적·정치적 요인에 국한해 해석하는 대신, 소련식 산업화를 사회주의적 형태의 ‘후발 산업화’로 규정하고 그 발전 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고유한 제도적 구조와 그 한계가 어떻게 국가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붕괴로 이어지게 했는지 밝혔다.
강연에 앞서 하 교수는 서울대 재직 시절 식민지 연구와 현장조사를 병행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소련을 보며 한국적 문제가 더 선명해졌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아는 것이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강연에서 하 교수는 소련 붕괴에 대한 기존 설명들을 검토했다. 기존 연구들은 경제·군사·정치·사회적 요인을 분절적으로 다루거나 이데올로기 분화·서구와의 접촉 같은 외부 요인에 치중했으나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 대 사회”라는 대결 구도를 넘어서 소련은 오히려 국가가 사회를 흡수한 특수한 형태였음을 강조했다. 이어 스탈린과 박정희의 사례를 나란히 제시하며 두 경우 모두 후진성에 대한 열등감과 급박감이 비현실적 목표 설정과 전통의 동원으로 이어졌음을 설명했다. 산업화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국가가 전통적 가치와 제도를 동원했고 이는 사회 동원의 강력한 수단이 되었지만 동시에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사회주의적 봉건주의(socialist feudalism)”와 “거짓 공동체(lying community)”였다. 후발 산업화의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현실을 왜곡하고 허위보고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는 단기적 생존 전략을 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거짓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제도화된 행위 양식으로 굳어져 공동체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community of pretension”은 장기적으로 체제의 신뢰 기반을 잠식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system reification이다. 하 교수는 이를 단순히 “의인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시스템 전체를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인식의 과정”으로 정의했다. 실제로는 누구도 체제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마치 다른 누군가가 파악하고 있다고 믿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러한 환상의 제도화가 바로 소련 체제가 유지된 원리이자 동시에 붕괴의 씨앗이었다. 이 틀에서 고르바초프 개혁의 실패도 설명할 수 있다. 사회주의를 강화하려던 시도는 오히려 그 정당성을 약화시켰고, 경제 성장 회복을 목표로 한 개혁은 오히려 붕괴를 앞당겼다. 당을 재생시키려던 민주화는 당을 해체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 교수는 이 역설적 결과의 근본 원인이 바로 system reification, 즉 체제 구성원 누구도 전체 구조를 알지 못하면서도 “있다”고 믿은 허상 속에서 시스템이 운영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하 교수는 근대화든 산업화든 단일한 ‘the’가 아니라 복수의 ‘many’가 있을 뿐이라며 보편적 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한국적 맥락에서 지역을 바라보는 연구, 각 지역의 맥락에서 사회와 제도를 분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맺었다.